입력 2020.09.03 16:14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공동체 경제학>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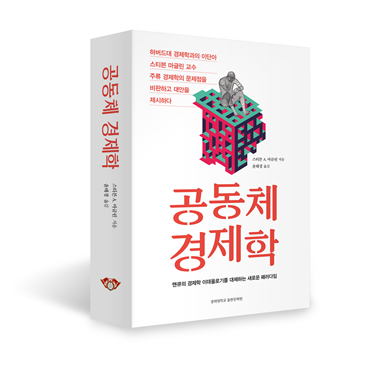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이단아 스티븐 마글린 교수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다
《공동체 경제학 The Dismal Science》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 출간되었다. 봉쇄,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코로나 방역 활동에서 새삼 알게 된 사실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타인과 공동체(community)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잊혀진 공동체의 가치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은 경제학이 어떤 시대 배경에서 탄생했고, 경제학 논리가 어떻게 공동체 파괴에 일조해 왔는지 명징하게 직조하고,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원저 출간과 국내 번역본 사이에 시차가 있지만, 인류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절실한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의적절한 출간이라 평할 수 있겠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 앨런 마글린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로, 1938년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해 1959년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우등 졸업한 경제학자로,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1968년 하버드대 최연소 종신 교수로 임용됐다. 미국계량경제학회 회원이자 세계경제학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마글린 교수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11년 9월, 미국에서 월가 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가 벌어졌을 때다. 그해 11월 초에는 하버드 점령 시위(Occupy Harvard)의 일환으로 맨큐 교수의 경제학 원론 수업을 듣던 하버드대 학생들이 강의실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하버드대 경제학과에서 이단아처럼 홀로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촉구해 온 스티븐 마글린 교수에게 ‘강의실 밖’ 강의를 요청했다. 스티븐 마글린 교수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1년 12월 7일, ‘맨큐의 경제학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학(Heterodox Economics: Alternatives to Mankiw’s Ideology)’이라는 제목의 공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의 핵심 내용과 메시지가 이 책 《공동체 경제학》 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 책의 부제는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가(How thinking like an economist undermines community)’다. 경제학자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주류 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주류 경제학의 가정에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관한 가정, 경험보다 합리성을 우선하는 지식 이데올로기에 관한 가정, 한계가 없는 세계, 특히 무한한 욕구라는 가정, 국민 국가야말로 가장 정당한 공동체라는 가정이 있다.
주류 경제학의 가정은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여러 공동체가 설 자리를 없앤다.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공동체는 개인이 본인 목적과 이익에 부합할 때만 유지하는 단순한 모임 관계에 지나지 않게 되고,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멸종 위기 동물처럼 사라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동체 넘어 인간 존재의 멸종 위기 맞이한
생존의 시대를 읽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마글린 교수는 이 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과연, 경제 개발 과정에서 경제학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라고.
경제학은 처음에는 유럽, 이후에는 북미에서 발전한, 근대성이라는 맥락에서 진화한 학문이다. 마글린 교수는 경제학이야말로 서구 근대성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학문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마글린은 서구 근대성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서구 근대성의 전제는 다른 이데올로기의 전제와 긴장 관계에 있다. 근대 서구와 다른 사회 구성체의 차이는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경제학의 가정을 수용한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 합리성, 한계의 부재, 국민 국가 같은 경제학의 가정에만 토대를 둔 사회는 없다.
물론, 시장은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경제 성장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긴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수명 연장, 건강 증진, 고통 완화, 영양 상태 개선, 고된 육체노동 감소 등 경제 개발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마글린 교수는 그러나, 시장 논리에 기반을 둔 사회가 실패한 부분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공동체다. 국가가 공동체의 소멸에 책임이 크지만, 시장도 공동체 소멸에 책임이 있다는 것. 본디 시장은 공동체의 규율과 통제에 복종했지만, 시장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자체적 시스템으로 바뀐 뒤에는 국가에 합류하여 공동체 소멸의 원인이 된다.
경제학은 시장에 공동체를 파괴할 힘을 실어준다. 그리고 시장 논리를 기반으로 세상을 구축하는 일을 정당화한다. 우리가 사는 ‘선진국’은 국민 공동체(national community)를 제외한 공동체가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국민 공동체가 설 공간도 좁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공동체 경제학》 각 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시장 경제와 경제학의 논리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화두를 던진다. 2장은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3장은 근대성의 첨단을 달리는 학문으로서 경제학이 지닌 특징을 나열한다. 4장은 근대성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주의를 경제적 측면에서 다룬다. 5장은 서구에서 근대성이 발전하게 된 시대 배경을 조망한다.
6장은 전근대 유럽에서 악덕이었던 이기심이 미덕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7장은 인간이 지닌 지식의 한계인 불확실성에 대해 경제학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준다. 8장은 알고리즘 지식을 우선하고 경험 지식을 무시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9장은 알고리즘 지식에만 의존하는 경제학의 한계를 짚는다. 10장은 국민 국가, 국민, 국민주의, 후생 경제학을 주제로 논의한다.
11장은 경제 발전으로 평균 소득이 늘었어도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와 경제학의 희소성 개념을 설명한다. 12장은 지구화(세계화)로 착취당하는 개발 도상국 노동자, 농민, 아동에 관한 관심을 촉구한다. 13장은 대항해 시대 이후 서구와 비서구가 접촉하면서 일어난 문화 충돌을 그린다.
20세기 후반, 대한민국 국민에게 경제 개발의 목적은 자식들에게 여유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목적과 전망에 부합할까? 오늘날 청년 세대는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평을 받는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며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 우리는 미래의 풍요로운 삶은 고사하고 집단적 생존을 위협받는 시대를 맞이했다. 그야말로 맨큐 교수로 상징되는 경제학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 《공동체 경제학》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새로운 대안의 길을 열어 보여줄 것이다.
책 속으로
경제학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셈하는 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것도 셈하라고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프리카 주민의 인명 가치는 미국인보다 더 낮다(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제학자가 미국 폐기물을 케냐로 수출하는 교역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지도 모른다).
p89~90_3장 근대성의 최첨단을 달리는 학문, 경제학
인클로저의 추진력이 무엇인지, 관점이 왜 중요할까? 효율이라는 관점으로 인클로저를 바라보면 공동체 붕괴를 생활 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체를 사회 조직과 경제 성장의 맞교환이란 관점으로 접근한다. 반면 역사를 분배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경제 성장의 부산물로 공동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수 있다.
p166_5장 근대성의 탄생
경제학의 기본 가정과 달리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자가 합리적 계산과 이익 극대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확률을 고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은 합리적 계산 외의 방법―직관, 통상적 행동, 권위―에 의존한다. 즉, 다른 지식 체계에 의존해 이익을 추구한다. 이는 공동체―공동체 구성원을 결속하는 인간관계―에 내재한 지식 체계다.
p222_7장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구성원 간의 지식 공유를 의무화하는 공동체가 사라짐에 따라 개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 특정 지식을 알리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 지식 전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는 점에서 지식은 일견 공짜로 보이지만, 자본가는 중요한 지식을 독점할 이유가 많고, 잠재적 경쟁자와 지식을 공유할 이유는 없다.
p268_9장 알고리즘 경제학의 한계
공정 무역 운동의 원칙적 목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공급 사슬 전반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나이키나 네슬레의 이익을 운동화 공장 노동자나 커피나무 재배 농민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넘어 공장 노동자, 농민, 소비자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 무역 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노동 착취 공장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운동화나 공정 무역 커피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p391_12장 비극적 선택의 경제학
지은이
스티븐 A. 마글린(Stephen A. Marglin)
스티븐 앨런 마글린은 1938년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해 1959년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우등 졸업한 경제학자로,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1968년 하버드대 최연소 종신 교수로 임용됐다. 미국계량경제학회 회원이자 세계경제학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는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본인은 단지 ‘마르크스를 싫어하지 않는’ 유대인이자 세속적 인본주의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기존 경제학 입문서가 편협하고 제한된 내용만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안적 관점의 글과 강의를 경제학 입문자에게 제공해 왔다.
2008년 발간된 이 책에서 마글린은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 보편적 가치가 아닌, 서구 문화와 역사의 산물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경제학 논리를 토대로 구축된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인간관계를 시장 거래로 대체함에 따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측면을 고발했다.
저서로는 《자본주의의 황금기: 전후 경험의 재해석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Reinterpreting the Postwar Experience》 《성장, 유통, 가격 Growth, Distribution, and Prices》 《노동력 공급 과잉 경제의 가치와 가격 Value and Price in the Labour-Surplus Economy》 등이 있다.
옮긴이
윤태경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번역가 모임인 바른번역에서 경제 경영 및 인문 사회 도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미쉐린 타이어는 왜 레스토랑에 별점을 매겼을까?》 《블랙 에지》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면》 《규모와 민첩성을 연결하라》 《마켓바스켓 이야기》 《혁신의 대가들》 《창의성을 지휘하라》 《메이커스》 《무엇이 가격을 결정하는가?》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 《기업의 경제학》 등 다수가 있다.
차례
한국어판을 내며 4
머리말 8
1장 경제학, 시장, 공동체 25
2장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이유 53
3장 근대성의 최첨단을 달리는 학문, 경제학 77
4장 개인주의에 대한 오해 111
5장 근대성의 탄생 145
6장 이기심, 악덕에서 미덕으로 탈바꿈하다 171
7장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5
8장 근대 지식 이데올로기의 근원 235
9장 알고리즘 경제학의 한계 261
10장 후생 경제학과 국민 국가 291
11장 소득이 늘어도 돈에 쪼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331
12장 비극적 선택의 경제학 367
13장 제국주의부터 지구화 시대까지 401
부록 1_경제학 개념의 한계 428
부록 2_인클로저 운동의 분배적 측면 471
옮긴이 후기 483
후주 490
참고 문헌 511
출처 527